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 나가는 한편, 여러 매체에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저서 중 공간의 미래란 책에서 "중산층 집이 방 세 개 아파트"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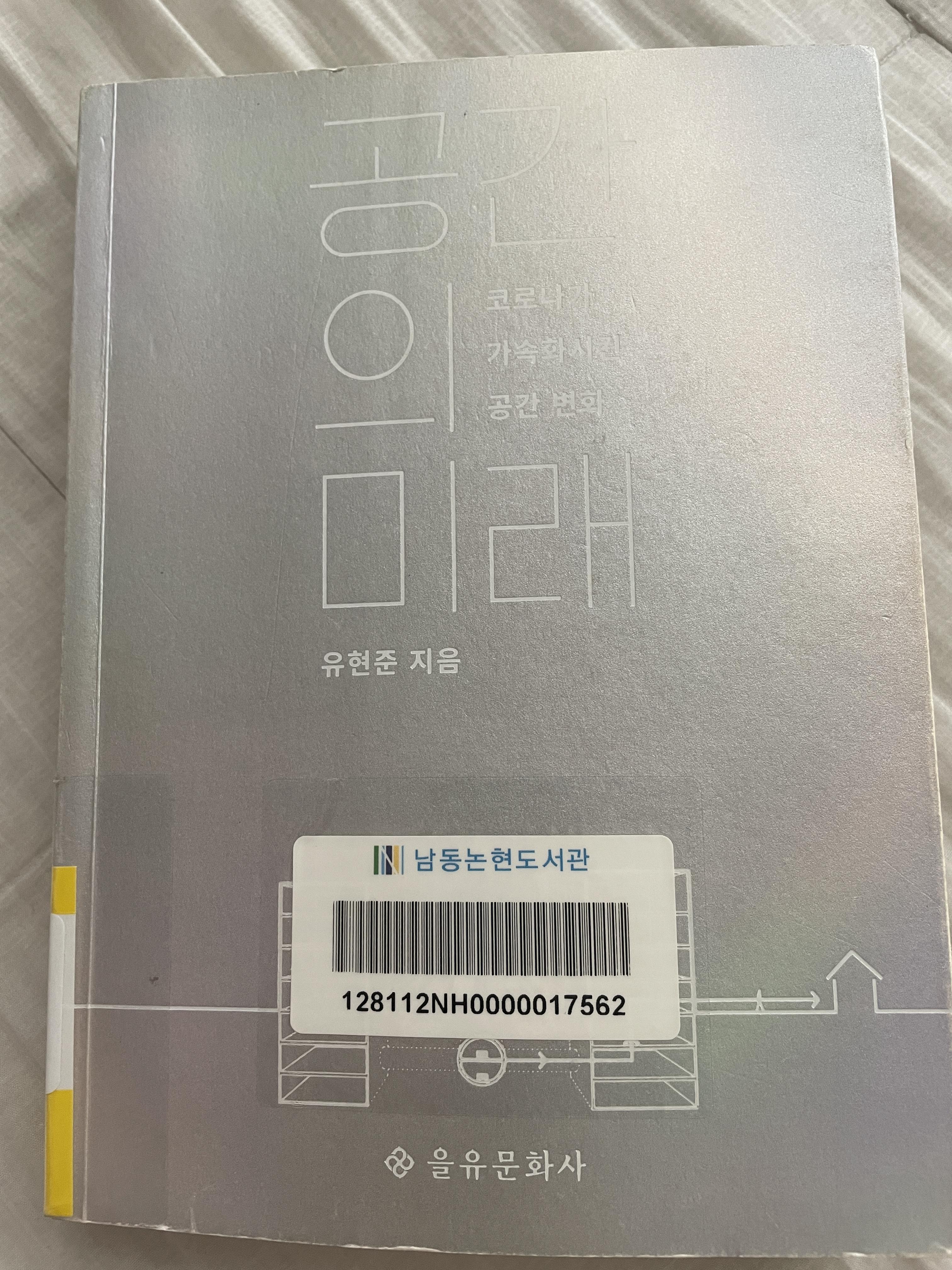
중산층 아파트의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 1개인지를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는 1970년대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옮겨오면서 한집에 사는 가족의 수는 예전 시골에 살 때와는 다르게 4인가족(아빠, 엄마, 아이들 2)이 표준이 됩니다. 이때 두 자녀가 방 하나씩 사용하고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면서 방이 세 개 필요했다. 방 세 개의 아파트 평면도가 표준이 된 것이다. 과거의 일터는 논이나 밭이었다. 밖에서 땀 흘려 일하니 일하러 가기 전에 씻을 필요가 없었다. 직장 동료도 친한 이웃이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선 지장 동료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었다. 근무하는 공간도 야외가 아니라 실내 공간으로 바뀌었다. 출퇴근 시에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와 좁은 공간을 같이 있어야 했다. 한경이 이러다 보니 일하러 나가기 전에 씻어야 했다. 매일 샤워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화장실에 샤워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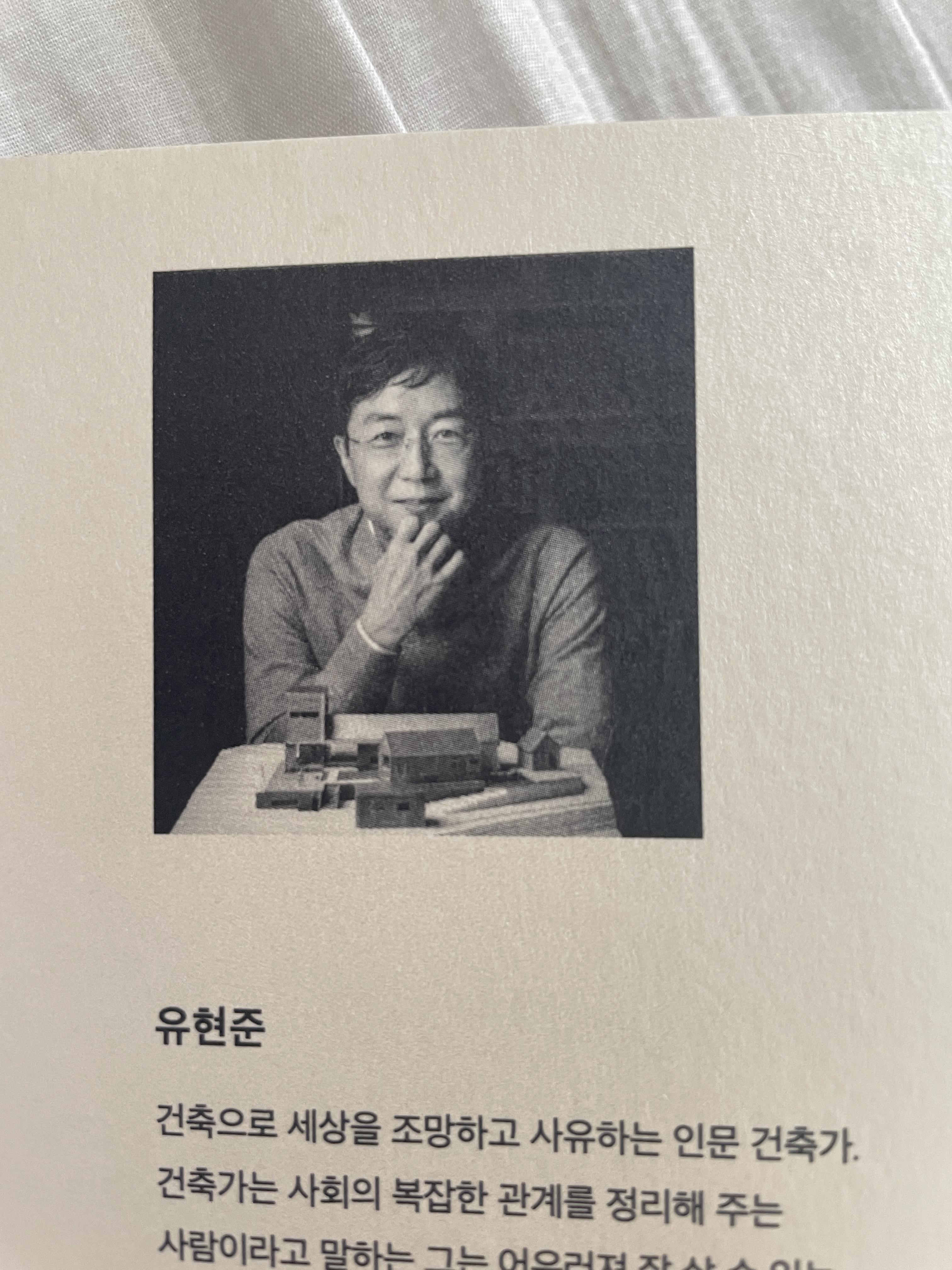
이렇게 방 세개와 화장실 하나의 중산층 주거 평면이 완성하게 된다. 게다가 부엌까지 넣다 보니 중산층 주택의 크기는 85m2(26평)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아침에 여러 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중산층 주거 평면에 화장실이 두 개로 늘어나게 된다. 예전에는 방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거둬 장롱에 넣고 그 자리에 밥상을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지만, 현대는 가사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문화가 발전한다. 세탁기가 상용화 디고 이부자리를 깔고 치우는 노동을 줄이기 위해 침대를 사용하면서 공간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공간적 사치가 발생하게 된다. 원래 서양에서 침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난방시스템이 온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은 가장 따뜻한 곳이 방바닥이고 추운 겨울에 이불을 깔고 방바닥에 가깝게 잠을 자야한다. 하지만 온돌이 없는 서양의 경우 반대로 바닥이 가장 춥고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하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양의 침대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방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또한 방바닥에 상을 놓고 밥을 먹다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자 식탁 놓을 자리도 필요해졌다. 방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서너 개의 기능을 했었는데 이젠 여려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방법이 "발코니 확장"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도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방법이었다.
만약 85m2가 넘는 아파트 평면을 만들면 여러가지로 세금의 기준이 잘라지게된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면적은 85m2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실내를 갖는 집을 지어야 했기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해서 집을 넓히되 공식적으론 85m2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만드는 편법이었다. 이렇게 실내 면적을 늘리고 그 늘어난 공간에 우리는 여러 물건을 사서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물건은 점점 늘어나게된다. 결국 소비를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활성화시킨 공간적 촉매제가 되고도 했다. 소유할 제품이 늘어나면 소유한 실내 공간의 크기를 키워야 했고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다시 소유물을 늘리는 순환 고리가 된다. 우리는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공간과 물건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은 피곤해 진다. 물건의 소유에 집착할 수록 집은 더 좁게 느껴졌고 그러다 2020년 코로나는 우리의 집에 또 다른 변하를 가져왔다. 평소보다 더 늘어난 집에서의 거주시간이 지금까지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간의 답답함으로 다가오게 된다.
집이라는 좁은공간에서 생활,학습 그리고 업무까지 하기에는 더 큰 공간의 집이 필요하게된다.그렇다고 당장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더 비싼 큰집으로 이사 가는것도 어렵다. 그렇다고 직자으로부터 먼 외곽으로 이사가는 것도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는 날에는 지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 일주일에 4일은 도시 속 좁은 집에서 보내고 나머지 3일은 넓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지방에서 보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구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혼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침대가 있는 방은 거실보다 좁고 창문이 작아서 거실보다 어둡다. 반면 거실은 면적도 제일 크고 창문도 바닦가지 내려와서 밝고 쾌적하다. 호텔방과 아파트방의 차이는 창문턱의 높이 차읻. 보통 호텔방은 창문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지만 아파트 방의 창문턱은 높다 . 침대를 거실로 옮겨 두면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두 명이 산다면 거실은 공용의 공간이어서 침대를 둘 수 없지만, 혼자 산다면 이 방법이 가능하다.
'북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줄거리 (0) | 2023.01.25 |
|---|---|
| 박헌영 평전 (0) | 2023.01.24 |
| 르코르뷔지에 (0) | 2023.01.19 |
| 리처드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 클래식 파인만] (1) | 2023.01.17 |
|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0) | 2023.01.16 |




댓글